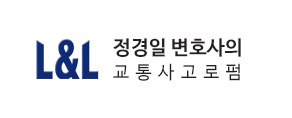일실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일실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1. 사망 근로자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
근로자가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정년 시점을 기준으로 “원래 받았을 총퇴직금”에서 “사망 시점까지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차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現在價)로 환산해 손해배상액에 반영하는 게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 방법이 아닌 “사망일 이후부터 정년 시까지의 퇴직금을 별도로 구하거나, 정년일 때의 총퇴직금에서 기근속분만 단순 공제” 같은 방식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확립됐습니다.
2. 실무에서 쓰는 대표 공식
현장에서 자주 쓰는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총퇴직금×사고 당시의 현가율)−기근속퇴직금}×노동능력상실률\{\bigl(\text{예상 총퇴직금} \times \text{사고 당시의 현가율}\bigr) - \text{기근속퇴직금}\}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예상 총퇴직금×사고 당시의 현가율)−기근속퇴직금}×노동능력상실률
예시: 만약 피해자가 사고일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10년 남았고, 10년 후 받을 예상 총퇴직금의 현가가 5,000만 원이라면, 그중 현재까지 근속(사망 시점)으로 이미 확보된 분(기근속퇴직금)을 뺀 다음, 그 차액에 노동능력상실률(예: 50%)을 곱하는 식입니다.
3. 사고일과 실제 퇴직일이 다른 경우
피해자가 사고 후 한동안 근무를 유지하다가 수개월 뒤 퇴직했다면, 예상 총퇴직금과 기근속퇴직금을 ‘같은 시점’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구체적 예시: A 씨가 사고 후 8개월 만에 퇴직했다면, 8개월 뒤 실제로 받은 퇴직금(= 기근속퇴직금)을 “사고 당시로의 현가”로 환산하고, 예상 총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해서 차액을 구하는 식이죠.
4. 공무원 사망 시: 유족연금과 퇴직급여의 차이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했다면, 애초에 ‘퇴직을 이유로 한 퇴직급여’라는 개념이 곧장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사망 사고에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실제 지급되거나 지급될 연금이 있는지 따져본 뒤,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사고 후 8개월 만에 퇴직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유족이 실제 수령했거나 받을 연금(또는 일시금)을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한 뒤, 이를 예상 총퇴직급여분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5. 결론: ‘예상 퇴직금 - 기근속퇴직금’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
결국, 불법행위로 사망(또는 퇴직)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 산정은 **“예상 총퇴직금의 사고 시점 현가에서, 기근속퇴직금(또는 유족이 실제 받은 금액)의 사고 시점 현가를 빼고,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하는 접근이 기본입니다. 공무원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 수령액 등을 반영하는 점이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에 도달했을 때 받을 퇴직금을, 사고로 인해 그전까지 받은 금액과의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교하게 추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고 직후 바로 퇴직했는지, 몇 달 뒤에 그만뒀는지, 공무원인지 사기업 근로자인지에 따라 세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