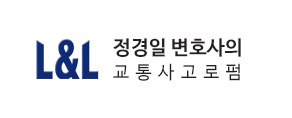근친자 위자료청구권과 피해자 청구권의 분리, 시효는 따로 적용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근친자 위자료청구권과 피해자 청구권의 분리, 시효는 따로 적용된다
1. 피해자 손해배상 vs. 근친자 위자료: 왜 서로 다른가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피해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근친자(가족, 배우자 등)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그 근친자들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청구권과 근친자의 위자료청구권은 비록 같은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서로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2. 피해자 본인 청구권 시효 만료, 근친자에게 영향 없음
가령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지나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근친자들이 가진 위자료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본인이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해 극심한 충격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피해자가 직접 배상청구권을 시효 내에 행사하지 못해 소멸되었어도, 그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은 다른 가족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그 청구권이 자동으로 따라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미성년 근친자의 위자료,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만 미성년자가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그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나 후견인)이 사고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적 행위를 하기 어려우므로, 법정대리인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3년이 지나면 그 권리도 시효로 소멸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초등학생인 아이가 교통사고로 부모가 크게 다친 모습을 보고 트라우마를 겪었다면, 그 아이의 위자료청구권은 부모(법정대리인)가 “사고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내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만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구체적 예시: 가족 모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
사례: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 A씨 본인: 사고로 인한 치료비·일실수입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이 있음.
2. 배우자(성인): A씨의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독립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 가능.
3. 미성년 자녀: 자녀 역시 부모의 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겪었다면, 자녀 명의의 위자료청구권이 존재. 단, 시효 계산 시 ‘법정대리인(부모)이 사고와 손해를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A씨가 본인 청구권을 깜빡 잊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해도, 배우자와 자녀가 행사할 위자료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단, 자녀 청구권은 미성년자의 시효규정에 따름).
5. 결론: 가족 청구권과 피해자 청구권, 시효 계산은 별개
정리하자면, 피해자 본인이 청구권을 놓쳐도, 근친자가 가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따라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 근친자의 청구권은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뿐 아니라 가족 또는 가까운 친족도 위자료청구권을 각기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각각의 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따져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뒤늦게 가족 청구권마저 시효 소멸로 상실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