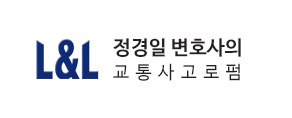장기소멸시효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은 언제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장기소멸시효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은 언제인가
1. 문제 제기: 불법행위 시점 vs. 손해 발생 시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장기 소멸시효’(제2항)라는 두 가지 규정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장기 시효를 판단하는 기준인 ‘불법행위를 한 날’이 과연 언제인가?”에 대해 학설과 판례는 오랫동안 엇갈려 왔습니다.
2. 초기 판례: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
과거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실제로 행해진 날”이라고 봤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그 시점이 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를 언제 인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0년만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3. 견해 변경: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기준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시각을 바꾸어, “가해행위가 있더라도 손해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단순히 사고가 일어난 날로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해서 시효가 끝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구체적 예시: 시간 차를 두고 나타나는 손해
예시 A: 산업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가 즉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가, 수년 후 질환을 진단받게 된 경우. 초기 입장대로라면 노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가 나타난 것은 뒤늦게이므로, 결과 발생 시점을 기산점으로 봐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예시 B: 교통사고 후 부상은 가벼워 보였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후유장해가 드러난 사례. 초기 판례대로라면 사고가 난 날로부터 10년이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판례 전환 후에는 부상 자체가 가벼웠던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심각한 후유장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게 됩니다.
5. 판례의 최종 취지: 관념적 손해 vs. 현실적 손해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완성되려면, 가해행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손해”가 단지 잠재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 형태로 발생해야 권리가 본격적으로 행사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손해가 잠재적·추상적 단계에서 벗어나 ‘현실화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컨데 독성 물질에 노출된 순간을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고만 보지 않고, 그 결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어져 비로소 손해가 구체화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6. 결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실화 원칙
정리하면, 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 10년의 기산점을 가해행위 시점으로만 보던 과거 입장에서, 대법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보도록 전환했습니다. 이는 후유장해나 질병이 뒤늦게 나타나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언제부터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이뤄집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면, 부상의 진행 정도나 의학적 소견, 환자 회복 과정을 종합해 시효 기산점을 집중적으로 입증·분석하게 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의학적 진단을 통해 결과 발생 시기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