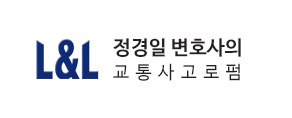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무엇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무엇인가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두 종류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0년의 장기 소멸시효: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 중 3년의 단기 시효를 판단할 때 ‘언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정확히 알았느냐’가 분쟁의 쟁점이 되곤 합니다.
2.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피해자가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 파악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1. 손해 발생 사실: 단순 타박상인지, 심각한 후유장해를 수반하는 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가해행위가 위법하고 과실이 있다는 점: 이를 모르면 피해자로서는 불법행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손해와 가해행위의 인과관계: 사고나 의료행위 등이 진짜로 현재의 손해(부상, 질병 등)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사고 같은 분야에서는 일반인 입장에서 의사가 과실이 있었는지, 해당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단번에 알기 어려워, 실제 안 날은 훨씬 뒤로 늦춰질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많습니다.
3. 판례 예시: 사고와 부상 인과관계가 늦게 밝혀진 경우
어떤 교통사고 피해자가 초진 당시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가, 이후 정밀검사로 “사고로 인한 골절”임이 밝혀지면, 피해자가 비로소 그때서야 손해와 가해행위 간 인과관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초진 때부터 시효가 달리는 게 아니라, 정밀검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 이 부상은 사고로 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의료사고에서도 “환자 가족이 의사를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의사)의 잘못과 환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점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했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4. 손해 정도·액수까지 알아야 하는지는?
반면, 피해자가 손해의 ‘정도’나 ‘구체적 액수’까지 정확히 알아야만 시효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손해의 전체 규모나 법률적 평가까지 전부 파악해야 시효가 흐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가해자의 위법·과실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면, 일단 시효는 개시됩니다.
다만 막연히 “어쩌면 이 사고 때문에 어디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라는 추정이나 의혹만 갖고 있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5. 결론: ‘현실적·구체적 인식’ 시점이 관건
정리하자면, 불법행위 소멸시효 3년은 피해자가 단순히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만 아니라, (1) 손해 발생과 (2) 가해자에게 위법·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3) 둘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정도를 실제로 인식한 시점부터 카운트합니다.
손해 정도나 액수를 전부 알아야 하는가? 아니오,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비롯됐다는 기초만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손해 추정·의문은? 막연한 의심으로는 ‘안 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사고처럼 전문 지식 필요한 경우: 환자나 가족이 전문지식 없이 과실 인과관계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시효 시작점은 훨씬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언제 손해와 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가해자 입장에서도 “언제부터 피해자가 제대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이 ‘알게 된 날’이 결정적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