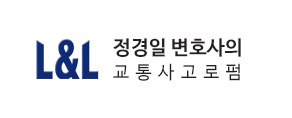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 부담비율’, 어떻게 정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 부담비율’, 어떻게 정할까?”
1. 외부(피해자) vs. 내부(가해자) 책임 구분
교통사고 등에서 여러 명이 가해자로 인정되면, 피해자에게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전액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끼리의 내부적 분담은 따로 정해지는데, 이를 우리는 ‘부담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A·B가 공동불법행위로 1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A에게든 B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1억 원 전부를 냈다면, A가 B에게 일정 몫을 구상 청구하려 할 때 “과연 B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느냐”가 문제됩니다. 그것이 곧 ‘부담부분’이며, 결국 두 사람의 ‘과실 비율’이나 ‘손해발생 기여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2. 부담부분 산정: 과실 비율이 기본
(1) 기여도가 분명하다면, 그 비율대로
A·B 중 A가 40%, B가 60%로 손해발생에 관여했음이 판명되었다면, 그 부담 부분도 4:6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기여도를 알 수 없다면 균등
판례와 학설은 “서로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 확실치 않다면, 부담부분을 균등(1:1)으로 본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다수의 가해자가 명확한 과실비율 산정이 어려울 경우, 똑같이 나누라는 것이죠.
3. 사전·사후 합의 가능하지만, 전부 전가 약정은 엄격 해석
여러 공동불법행위자가 미리 혹은 뒤늦게 “우리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하자”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그 약정의 해석은 까다롭습니다.
판례 예시: 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하수급인이 고의·과실 여부를 막론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전부 책임진다”라고 적혀 있어도, 이를 곧바로 “하수급인이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100% 짊어진다”는 의미로 단정 지을 순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 분담을 완전히 한쪽에게 떠넘기는 식의 약정은 엄격히 해석하며, 그 문구가 아주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과실 비율대로 책임을 나눈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4. 구상권 행사 시, 구상채무는 분할채무가 원칙
A가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 후, B·C 등 여러 명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이때 B·C가 각각 30%, 20% 과실로 기여했다면, B는 30%, C는 20%를 A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 구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B와 C가 “50% 중에서 누가 얼마를 낼지”를 또다시 부진정연대 식으로 묶어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외: 구상권자(손해를 먼저 변제한 사람)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수인(여러 명)의 구상 의무 사이를 부진정연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해자(구상권자)는 전혀 책임이 없는 데도 대신 배상했다면, 나머지 책임자들이 ‘모두’ 그 금액을 일단 갚아야 할 의무가 있고, 서로 내부에서 정산하라는 식의 판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5. 정리: 내부 정산은 과실 기준, 완전 전가 약정은 신중 해석
공동불법행위에서 외부적으로는 전원(부진정연대) 책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과실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여도가 애매하면 균등 분담으로 처리합니다. 설령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약정이 있어도, 법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쉽게 전부 떠넘기지 않습니다. 결국, 구상권 행사 시 ‘내부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협의하거나, 법원이 과실비율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정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