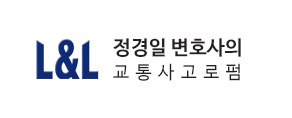산재보험, 재해보상과 사회보장의 이중 성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산재보험, 재해보상과 사회보장의 이중 성격
1. 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줄여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고나 질병을 겪을 때, 국가가 직접 보험자가 되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회사(사업주)는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보호는 물론, 뜻밖의 재해로 사업주가 큰 재정압박을 받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해준다는 의미도 갖습니다.
2.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에 가까운 이유
산재보험을 책임보험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 범위를 넘어선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합니다. 즉, “재해를 사회적으로 분산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지키고,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큽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보험’의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국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사회보장’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산재보험급여 종류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병원 치료와 각종 약제·의지·간병·이송 등 필요한 요양을 지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예컨대 공단 지정병원에서 무상 치료를 받거나, 요양비를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있다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제52조). 예컨대 다쳐서 3개월 쉴 때 해당 임금을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것이죠.
(3) 장해급여
다친 뒤 증상이 고정돼, 신체에 장해(장애) 상태가 남으면 그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혹은 장해보상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제57조). 예컨대 손가락을 잃었거나,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식으로 영구적 기능 상실이 있으면 금전이 지급됩니다.
(4) 간병급여
치료가 끝났더라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하면, 실제 간병을 받은 근로자에게 간병급여가 나옵니다(제61조).
(5) 유족급여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면, 그 가족에게 유족급여(연금·일시금)가 지급됩니다(제62조). 이는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과 사실상 같은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상병보상연금
요양이 2년 이상 장기화되어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폐질등급에 해당하고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제66조).
(7)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의비가 평균임금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제71조).
(8) 직업재활급여
부상·질병으로 노동능력이 저하된 근로자를 재취업·재활훈련 등으로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제72조).
4.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과 산재보험 급여, 어떤 관계?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과 비슷한 항목
산재보험 급여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요양·휴업·장해·유족 등)과 보상사유가 겹칩니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도 ‘손해전보 + 생활보장’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어,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과 비슷하다고 평가됩니다.
재원
산재보험 재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부담의 보험료를 토대로 운영되지만, 국고(세금) 지원이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책임이라는 면(책임보험)과 국가가 근로자 생활을 보장한다는 면(사회보험) 양자의 절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산재보험, 책임보험을 넘어선 사회보장 장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굉장히 유사하나,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고, 사업주 또한 예기치 않은 거액 배상 부담을 피할 수 있죠. 국가는 일부 예산 지원을 통해 근로자를 안전망 안에서 보호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며, 근로자 입장에선 법적 다툼 없이도 기본적 손해를 즉시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사용자)도 개별적으로 큰 금액을 바로 물어내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게 되는 셈이죠.
전반적으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보상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과 거의 겹치는 항목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사회보험의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