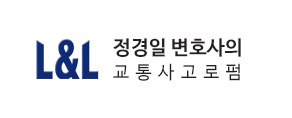경찰차에 치였는데, 가해 공무원은 개인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경찰차에 치였는데, 가해 공무원은 개인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핵심 요약: 공무원 개인의 책임 범위와 국가배상법·자배법의 차이)
A: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공무원 개인은 국가배상법 기준으로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배법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배법상 “운행자”는 경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의무가 쉽게 인정되기 때문이죠.
예컨데, 경찰관 B 씨가 긴급 출동을 한다며 경찰차를 몹시 과속하다가 인근 주민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고 해봅시다. 국가배상법 관점에서는 B 씨의 과실 정도, 즉 ‘고의·중과실’ 여부가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자배법상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가 생겼다”는 것만 인정되면, B 씨는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례 1: B 씨가 “나는 단지 지시를 따랐고, 과속도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해도, 그건 국가배상법의 논점일 뿐 자배법상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이 아닌 자배법 제3조에 따라 바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다만 예외적으로, 군인·경찰공무원 등 특정 신분의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사고로 본인이 다친 상황이라면, 헌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별도로 제한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즉,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일부 재해보상금 제도로 갈음되는 영역이 있어, 국가 상대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먼저 자배법 규정이 적용되어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가려지게 됩니다. 그 뒤 국가배상법상 국가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2차적으로 판단하죠.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무원 사고니까 국가가 알아서 책임져주겠지”라고 단순하게 넘기기보다는, 자배법을 통해 운행자로서 개인 책임도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해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